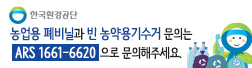수중의 플랑크톤이 작은 물고기의 먹이가 되고, 그 작은 물고기가 좀 더 큰 물고기에게 먹히고 그 물고기는 또 물새의 먹이가 되며, 그 물새도 매나 독수리와 같은 맹금류 또는 포유류에게 먹히는, 이러한 동물이 먹고 먹히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먹이사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수생동물뿐만 아니라 육생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에게 해당하며, 실제로는 단순한 피라미드형이라기보다는 복잡한 망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인간, 북극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먹이사슬 안에 화학적으로 안정되고 동물에게 흡수되면 대사나 배설이 잘 되지 않는 반면, 지방에 녹기 쉽고 효소나 단백질 등에도 결합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오면, 먹이사슬의 단계를 올라감에 따라 농축도가 높아집니다. 이것이 「생물농축(bio-magnification)」입니다. 생물농축이 진행되면 건강상에 만성적인 영향이 나타날 위험이 있습니다. 생물농축(bioconcentration)과는 다릅니다.
○침묵의 봄에 대한 진지한 대응
생물농축은 라이첼 카슨의 『침묵한 봄(1962)』에서 다루어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클리어호의 예가 유명합니다. 이 호수에서는 여름철, 유스리카 또는 꾸정모기류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낚시꾼과 야영객을 괴롭혔습니다. 그 때문에 1949년부터 1957년에 걸쳐 한 해에 몇 번씩 DDT와 비슷한 살충제인 DDD가 호수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불쾌한 벌레는 줄어들었지만 클리어호수의 명물이었던 물새 카이트브리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1950년말의 조사에서는, 카이트브리 몸의 지방 중 DDD농도와 호수의 농도를 비교한 농축 계수는 178,500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생물농축은 반드시 수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사람의 모유에서도 DDT가 검출되었으며, 또한 먼 남극 펭귄의 지방층에도 농축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인류에게 큰 충격을 주어 환경과학의 발달을 촉진시켰고, 그 후의 농약 개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뉴욕타임즈 논설위원의 코멘트에 따르면, 라이첼 카슨여사에 의해 지적된 문제에 농약업계는 잘 대응하여 환경정의와 기업윤리를 지켜왔다고 합니다. 즉, 「울새나 그 외 다른 야생의 새들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침묵의 봄이 찾아온다고 하는 카슨여사의 무서운 시나리오는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녀의 예언이 빗나간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그녀의 진단이 정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회와 농약기업은 그녀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 DDT 사용금지 등 필요한 개혁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그녀가 예언한 침묵의 봄을 적어도 지금까지는 피할 수 있었다」고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생물농축성에 대해서도 평가를 엄격히
한국에서도, 『침묵의 봄』이후 DDT등 유기염소계 살충제의 인체로의 축적 영향이 우려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환경 중에 축적하는 먹이사슬에 의해 농축될 가능성이 있는 화합물은 농약으로서 개발되는 일이 없어졌고, 또한 기존의 농약이라도 물고기 등 생물에게 위험성이 높은 것은 법률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DDT나 BHC와 같은 생체로의 축적성이 높은 약제는 이미 모습을 감추었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농약은 생체 농축율도 낮고 분해․배설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 몸에 축적되는 등 장기적인 오염, 축적의 걱정은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