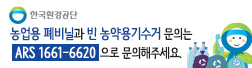식물 먹어치우며 번식 ‘제2의 황소개구리’
겨울엔 동사했는데 올핸 전국서 대거 생존
올겨울, 강원도 철원과 평창, 홍천 등지의 농경지에서 예전에 없던 현상이 나타났다. 한파가 몰아 닥쳤는데도 논 주변 개울 곳곳에서 탁구공(지름 4㎝) 크기만한 왕우렁이(Golden Apple Snail)들이 여전히 산 채 발견된 것이다. 꽁꽁 언 얼음장을 깨고 개울 바닥에서 건져낸 왕우렁이도 마찬가지였다.
남미 아열대 지역이 원산지로 1983년 국내에 도입된 이 외래종은, 지난 25년간 강추위가 닥치면 대부분 동사(凍死)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올해, 이변이 발생한 것이다.
◆5번째 생태계 교란종 되나
이런 사실은 작년 한 해 동안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국의 왕우렁이 서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환경과학원은 23일 “왕우렁이가 국내에서 가장 추운 지역인 철원에서도 살아남는 등 전국 각지에서 월동(越冬)에 속속 성공하고 있다”고 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남해안 일부 지방에 국한됐던 왕우렁이의 월동선이 수년 새 강원도 북부지방까지 치고 올라와 왕우렁이의 서식지가 전국으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환경과학원측은 “정확한 이유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왕우렁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선정한 ‘세계 최악의 100대 외래종’ 목록에 포함될 만큼 왕성한 번식력으로 ‘악명’이 높다. 환경과학원 김종민 박사는 “연간 최대 3000여개의 알을 낳을 정도로 번식력이 좋은 데다 각종 연한 풀과 수초(水草), 채소 같은 거의 모든 식물을 먹어 치울 만큼 식성이 왕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황소개구리나 붉은귀거북 등 기존 생태계 교란종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외래종 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왕우렁이를 ‘법정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상황에 비춰 교란종 지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왕우렁이는 2001년 12월 붉은귀거북에 이어 7년 만에 국내 다섯 번째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다.
◆”작년 한 해만 5억마리 생태계 유입”
왕우렁이는 당초 식용(食用) 목적으로 수입됐다. 대만과 필리핀, 일본 등 우리보다 앞서 왕우렁이를 도입한 나라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맛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부분 시장화에는 실패한 편이다.
농업과학기술원 박형만 농업해충과장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이라며 “현재 시중에 팔리는 ‘우렁된장’의 경우 대부분 왕우렁이가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 유입된 왕우렁이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친환경 왕우렁이 농법’에 활용돼왔다. 이 농법은 어린 벼를 심은 뒤 논에 왕우렁이를 흩어 놓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잡초를 뜯어먹도록 하는 방식을 쓴다. 이렇게 하면, 수질과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제초제 없이도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03년 3900㏊이던 왕우렁이 농법 재배 면적은 2005년 8000㏊, 작년엔 5만1000㏊로 늘었다.
박형만 농업해충과장은 “보통 논 1㎡당 왕우렁이 한 마리가 투입되기 때문에 작년 한 해만 전국의 논에 5억 마리 가량이 풀렸다”고 말했다.
일부 농가의 경우, 모내기 철에 활용이 끝난 왕우렁이들을 그대로 방치해 수로 등을 통해 왕우렁이가 자연생태계로 빠져나가거나, 홍수에 휩쓸려 한꺼번에 대량 유출되는 사태도 빚어지고 있다.
사진설명 : 탁구공 크기(지름 4㎝)만한 왕우렁이 성체의 모습. 왕우렁이 한 마리는 한 번에 200~600개씩, 연간 최대 3000여개 알을 낳는다./국립환경과학원 제공.〈2008.03.24, 조선일보〉.